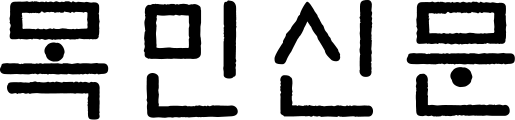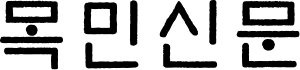김양배 칼럼니스트 지식재산권전문가(특허, 상표)

강사(强仕)는 '굳쎄게 일하다‘ 또는 힘차게 일하다'라는 뜻이다.
‘마흔 살’은 단순히 나이를 뜻하는 것 외에도, 사람이 나이 마흔이 되어야 비로소 벼슬에 나아가도 무리가 없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또 그 나이에 이르기까지 아직 관직을 제수받지 못하면 마흔 살 즈음에는 힘써 벼슬에 나갈 시기라는 뜻도 있다.
예전에는 마흔이 되면 신체는 절정에 이르고, 정신과 인격은 완성된다고 여겼다. 그래서 벼슬을 시작하는 나이로 ‘강사(强仕)’를 마흔이라 했다.
마흔 살이 되어야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철학과 인격을 갖추게 되어,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을 자격을 온전히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강사는 논어 '위정편(爲政篇)'의 사십이불혹(四十而不惑)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仕)' 자(字)는 섬길 사이자 벼슬 사자로 관리의 기본 임무는 '먼저 백성을 섬기는 데 있고 벼슬(관직)은 그 다음이다'라는 선조들의 큰 지혜가 담긴 글자가 아닐 수 없다.
벼슬은 단순히 지식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이끌 고결한 인격과 확고한 정치적 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자는 마흔이 되어서야 그러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본 것이다.
마흔 살이 되어야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철학과 인격을 갖추게 되어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을 자격을 온전히 갖추게 된다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다.
세종부터 성종까지 여섯 임금을 섬기며 45년간 조정에 몸담았던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은 ‘벼슬의 꽃’이라 불리는 문형(文衡, 대제학)을 23년간 맡고, 23차례 과거시험을 주관한 학자이자 정치가였다.
그는 '원단(元旦)'이라는 시에서 마흔의 의미를 ‘마흔 살은 인생에서 왕성하게 일할 땐데(四十是强仕) 오늘 아침 마흔에다 두 살이나 더 먹는군(今添又二春)’이라고 읊었다.
이춘二春은 두 번의 봄을 맞이했으니 ‘두 살’이라는 뜻이다. 서거정은 마흔을 ‘왕성하게 일할 시기’로 인식하고 그 나이에 걸맞은 자기 성찰을 시로 남겼던 것이다.